어쩌다 보니 로스쿨 : INTRO
어쩌다 보니, 올해 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곳의 학생이 되었읍니다..; 도입된 지가 벌써 12년째로 아직까지도 현대판 음서제라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로스쿨이라는 곳에 빽도 절도 없는 나같은 놈이 어떻게 입학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삐빅 음서제는 없었습니다), 30여년 인생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늘 그래왔듯 손톱 때만큼의 노력과 엄청난 우주의 기운의 도움이 있었으리라 짐작만 할 뿐이다.
사실 나는 산만하다 싶을 정도로 전공이 많다. 학부와 석사는 경영학, 그 중에서도 (언젠가부터 혁신이라는 단어가 만연하게 사용되어 조금은 알려졌을 지 모르지만) 완전한 메인스트림은 아닌 기술경영이라는 분야를 전공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통계와 데이터에 꽂혀 또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박사과정은 공학(기가 맥힌 전공세탁) 분야 중 하나를 전공하게 되었다. 물론 능력이 미천하여 현재 수료에 그쳤지만(외국에서는 ABD; all but dissertation이라고 포장하는 것도 보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부끄러운 수료였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자부하는 교수님 밑에서! 매우 좋은 분들로만 가득한 주변 환경의 보살핌을 받으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좋은 쪽으로) 세상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읍니다. 읍읍 마무리가 안 되네;;; 암튼 진짜임!
사실 글 몇 개 쓰다 말고 몇 년째 방치중인 이 공간에 글이나 주저리주저리 써보고자 생각이 든 건 최근에 자극이 된 어떤 인간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공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로스쿨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음서제나 로시오패스 얘기 빼고) 그 엄청난 공부량이 감당이 되냐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한 학기를 다녔는데도 멍청한건지 무딘건지 걱정이 되는 날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날들이 더 많다. 물론 그나마 경험한 첫 학기가 코로나 시국에 의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고, 완화된 상대평가라는 요상한 성적평가방식의 혜택개꿀을 누린 탓에 최소 B+의 학점을 받긴 했으나 하위 50% 중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동기나 선배들이 코피 터져가며 공부하는 모습도 못 봤고, 암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고 핑계를 대보지만 난 망한듯 ㅠ 암튼 희미해져가는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초심 같은걸 찾아보고자 하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간을 내어 글을 씁니다.
어쩌다 오게 되었을까요
입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상당히 복잡다기하다. 대학 동기 중 거의 유일하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의 영향도 있었고, 논문이 너무 쓰기 싫어서 도망칠 궁리를 한 것도 있고, 어릴 적 잠시나마 법조인이 꿈이었던 그 시절의 기억도 있고… 뭐 짜잘한 계기들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거든 적어보기로 하고,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가장 최근에 하던 일들에 있었던 것 같다.
1. 어설프게 할 바에 제대로 공부해보자 (FAIL)
2016년부터 연구원 생활을 하며 여러 연구과제의 진행을 도울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시대의 흐름상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특히 병원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유의미한 것들을 도출해내는 모델이나 SW를 개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하나같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규제가 주된 이슈 중 하나였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아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당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이고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언어로 정해져 있어 정확히 알 방법이 없었다. 물론 나는 한낱 연구원따리라 시키는 일만 잘 하면 되는 입장이었지만 교수님의 은혜로 다양한 컨퍼런스나 학회, 미팅에 참석하면서 어깨 너머로나마 듣는 얘기가 많아졌고, 자연스레 관심도 많이 가게 되었다. 직접 각종 법령을 찾아보기도 하고, 같은 조직에 계시던 전문가 교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럴거면 그냥 법 공부를 제대로 해볼까하는 소소한 생각이 현실이 되었다.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공부랑은 다르다.

2. 내가 (비교적) 잘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자 (FAIL)
사실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같은 주제들(가령 규제의 정당성을 논하는 전통적인 연구들에서부터 규제가 가지는 비효율성, 즉 정부실패와 기술혁신간의 관련성을 논하는 연구들까지)은 학부, 석사과정에 있던 각종 세미나 수업을 거치며 한 번씩 접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처별 규제 건수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등 각종 조작적 정의로 규정된 변수 중 하나로만 접했던 ‘규제’를 실제 연구개발을 하며 맞닥뜨리니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너낌을 받았다. 애매하게 만들어진 규제 하나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 될 기술혁신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느낌이랄까(사실 내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어련히 똑똑하신 분들이 다 해답을 찾아주실 것인데 왜 나대는지 좀 쪽팔림;) 여튼 아주 포장하여 말하자면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간극이 더욱 크게 느껴져갔던 것은,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 주시던 분이 퇴사하시면서, 자격미달인 내가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역할을 맡으면서였던 것 같다. 일이 기한 내에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옆에서 관망하던 것보다 상상이상으로 훨씬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시대가 점점 융합이 당연한 방향으로 흐르다못해 휴먼ICT융합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 같은 기괴한 융합전공학과가 생기는 등 다학제적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 혹은 실무진 분들은 고유의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이셨기에 그 분야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알아듣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여러 전공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말귀가 조금 트여있었다는 점이다. 약간의(사실은 좀 심한)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나무위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 근간에는 내가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어느 분야라도 손톱 때 만큼은 아는 척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함에 있어 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다. 자매품으로 눈치가 빠르다거나 초반 이해가 빠르다거나(물론 도착점에 가면 맨 뒤에 있음) 하는 말들도 많이 들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넓고 얕게 무언가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확장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런 생각은 한 10% 비중 정도 되려나 모르겠다. 전년도 리트 풀어보니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온 게 50%는 될 듯ㅋㅋ 리트 짱짱시험! 근데 이것도 결국은 어려서부터 다방면에 관심이 있었다보니 책도 많이 읽고 해서 뭐 이것저것 도움이 많이 된 듯 함.

3. 이제는 제발 전문성을 가지자 (FAIL)
위에서 확장성 어쩌구저쩌구 내뱉어놓고 전문성을 논하는게 조금 웃기지만, 전문성에 대한 욕심도 매우 컸다. 박사과정 당시 남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겠지만 괜히 나 혼자 찔려서 문돌이 출신이라는 얘기도 잘 안 했었고,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마다 나는 순수혈통이 아니라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에 빠지곤 하는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유사PM을 맡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도 괜히 소심해지고, 무언가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서 많은 서터레스를 받기도 했다. 요새 아무리 그 위상이 하락했다지만 그래도 전문직인데, 어디가서 허세를 부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심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계기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다.

초심 어디감;
초심을 다지자고 시작한 글쓰기가 요상한 방향으로 흘렀지만; 종합해보면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이 곳에 오고자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한 학기와 방학 한 번을 보낸 지금까지는 내 선택에 만족한다. 서른이 넘어 다시 학생이 되었음에도 걱정보다는 축하가 살~짝 앞서는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새로운 지식을 채워간다는 점도 그렇고,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행동의 기준(?)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도 그렇다. 잘 마무리하여야 좋은 기억이 되겠지만, 그런 걱정은 차차 하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나는 별로 힘든지 몰랐는데) 힘든 일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더라. 물론 나는 학부가 그리 뛰어나지도 않으며 매 번 전공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두다보니 학점도 거지같았고 살아오면서 법과 관련된 그 어떠한 활동도 한 적 없었기에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리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게 우리 학교 온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이 무뎌서 별로 안 힘들게 느꼈을 수도 있읍니다; 양해바람). 그래도 그 땐 정말 재밌게 준비했었던 것 같다. 공부하다 또 싫증나면 하나씩 써 봐야지 생각하며 오늘은 일찍 자야징~~
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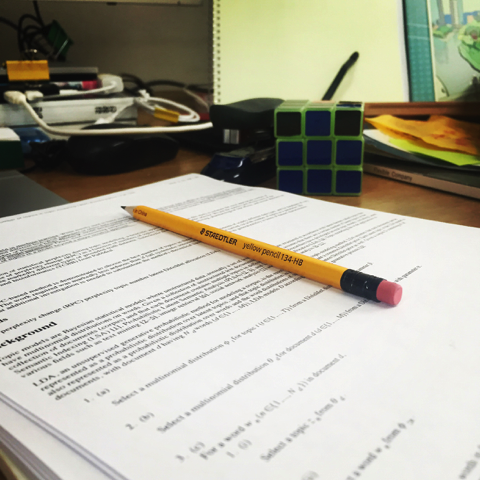
Leave a Comment